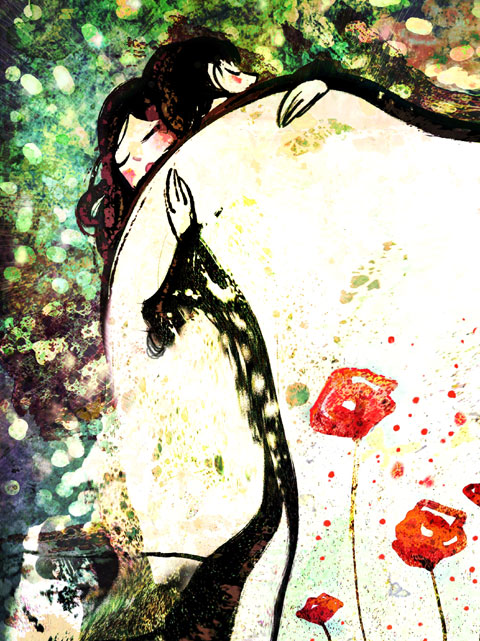
▲ 일러스트=클로이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詩)] [25]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정 희 성
어느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1974년>
[시평]
70년대, 그 '가파른 시대'의 사랑
시집 《저문 강에 삽을 씻고》에 실린 정희성 시인(63)의 얼굴을 바라본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다. 단호함과 함께 신중한 결기 같은 것이 느껴진다. 다른 시집《詩를 찾아서》와 《돌아다보면 문득》에 실린 사진들도 차례로 바라본다. 그대로 부드럽고 편안하다. 이제는 노경이라고 해도 실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 실린 시들도 그 사진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의 시는 젊은 시절 이른바 '가파른 시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는 《詩를 찾아서》의 후기에 "내가 시를 쓰기 시작한 1970년 이후 20년 간은 가파른 시대였다(…) 유신에 반대하던 나의 벗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 마침내 나는 고전적인 시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시인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라고 '겨울'의 사랑을 노래한다. 그 사랑은 사랑 자체의 온도를 노래하지 못한다. '하나의 꿈'을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일종의 동지적 관계처럼도 보인다. 그래서 더 쓸쓸하다.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노래해도 늘 시대의 고뇌를 동반해야 했던 비극이 가난한 시절의 옷가지들처럼 쓸쓸하게 비치는 것이다. 사랑의 뜨거운 온도 대신 깊게 가라앉은 '희망'을 어렵사리 불러내야 하는 힘겨운 주인공들을 바라보라. 파김치가 되어 힘겹게 만남을 이어가는 가난한 젊은 연인의 모습이 떠올라 안쓰럽기만 하다. 그럼에도 내면에는 서로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비단'을 만들어보자 하는 꿈이 꿈틀대고 있으니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생존의 에너지인가.
시인은 그 시대를 벗어난 어느 날 문득 봄이 오려는 기미를 이렇게 노래한다. '이제 내 시에 쓰인/ 봄이니 겨울이니 하는 말로/ 시대 상황을 연상치 마라/(…)/ 나는 사랑을 시작했네/ 저 산에도 봄이 오려는지/아아, 수런대는 소리' (〈봄 소식〉). 그 봄이 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을 시작했다'는 것. 이제 겨울이 가고, 아니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오는 순리처럼 시대를 벗어난 순연한 사랑을 시작했다는 고백이 두 편의 시의 간격을 메우며 환희롭다.
'꽃대궁만 있고 잎은 보이지 않았다/(…) / 꽃이 잎을 만나지 못한다는 상사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마음인 게라고/ 끝없이 저잣거리를 걷고 있을 우바이/ 그 고운 사람을 생각했다'(〈시를 찾아서〉)고 잔잔한 사랑의 물결 속을 걷는 사람을 그는 노래한다. 어느 자리에선가 조용히 어린아이처럼 걱정에 가득 찬 표정으로 노모를, 또 가정사의 사소한 걱정을 아주 아주 진지하게 털어놓던 순수한 음성도 생각난다.
'현대시100년-애송시100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 [27] 세상의 등뼈 - 정 끝 별 (0) | 2008.11.06 |
|---|---|
|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詩)] [26] 그대에게 가고 싶다 / 안 도 현 (0) | 2008.11.06 |
|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詩)] [24] 원 시 (遠 視) / 오 세 영 (0) | 2008.11.06 |
|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詩)] [23] 질투는 나의 힘 / 기 형 도 (0) | 2008.11.06 |
| [한국인이 애송하는 사랑시(詩)] [22] 민 들 레 / 신 용 목 (0) | 2008.11.06 |